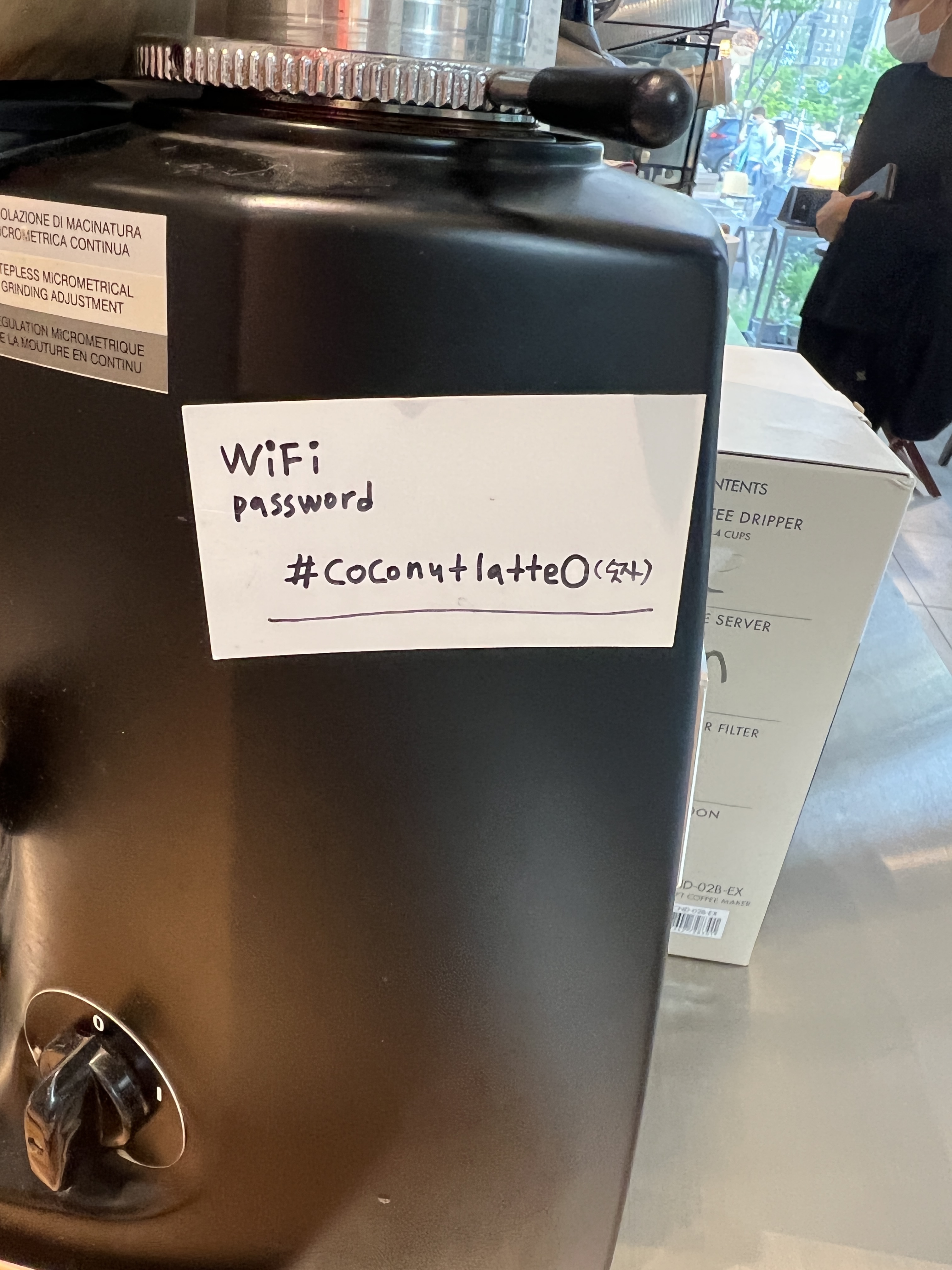자신이 정의와 선을 독점하고 있다고 믿는 자가
최악의 폭력과 악을 행한다.
그렇다면 서로 각기 대척점에 있는,
그런 놈 2명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각자 가진 모든 걸 걸고 싸울까 싶다가,
아, 아마 서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자기들끼리는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말이다.
인터넷만 보면 이미 세상은 멸망 직전이다.
그러나 행궁동에 가보자.
거기에 남혐, 여혐이 어딨나.
그저 주체 못할 사랑으로 가득한 남녀들이 있을 뿐이다.
이건 마치 법원 판결사례만 보고
이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없겠구나 싶어진다.
여지를 두는 것은 고달프다. 아무런 여지도 두지 않는 것은 편하다.
내가 항상 옳은 것 같다는 안락함에 젖어 나 자신을 최고 지성의 인간으로
상정하며 스스로를 절대화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인간에겐 더 이상의 변화란 없다. 변질만 있을 뿐이다.
무수한 실수와 실패를 겪은 게 아니라, 무수한 변화의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부족해서 당한 거라는 식으로 김영하가 말한 걸 봤다.
잘못은 나의 것이지만, 힘의 부족은 상대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위안이 된다. 문제는 나의 힘이 덜 셀 때, 나도 누군가를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당하기 싫으면, 당하게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겠다.
나는 다른 이에겐 타인이다.
나는 타인이다.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백과사전이었던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였던가. 그 책은 읽어볼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직접 겪어보기 전까진 알기 어렵다. 궁금하다면 빌려서 읽으면 되겠지.
나라는 인간의 한계가 곧 나의 가능성이다.
뇌스트레칭이란 말보단 어쩌면 뇌청소라고 하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무 이야기나 막 써도 되는 건 얼마나 즐거운가.
허나 또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토록 애달프고 황홀한 날에.